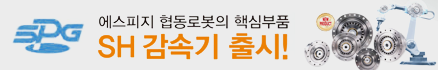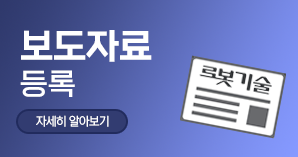세브란스 병원의 로봇 수술 400회 돌파를 즈음한
수술 로봇의 현황 및 국내 적용사례
본 기사는 2007년 7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개최된 ‘Robotic Surgery Symposium’ 자료 중, 세브란스 병원 내시경/로봇수술센터장인 이우정 교수 발표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자료 : (주)NT 리서치 www.ntresearch.net
국내의 수술 로봇 도입 사례 : 세브란스 병원
2005년 7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원격수술용 로봇 ‘다빈치 시스템’을 이용해 담낭절제수술을 진행했다. 이 사실이 국내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2005년 새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하며 들여온 최첨단 의료장비중의 하나인 수술용 로봇 ‘다빈치 시스템’은 최소침습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로봇이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환자에 몸에 3~5개의 구멍을 뚫고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 팔을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은 후, 의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3차원 입체영상을 보면서 수술할 때와 같은 손동작을 통해 이 손놀림이 로봇 팔로 그대로 전달되어 수술을 하게 되는 수술장비이다.
이 수술은 고가의 장비(약 25억) 및 소모성기구(장비의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한 수술 당 약 700만원)의 가격이 고가이고 아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약 1,000~2,000만원의 수술비가 추가로 드는 수술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선뜻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의 만족도와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매일 2~3건의 로봇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 5월부터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로봇수술이 시작되었으며 벌써 10명을 넘어섰다. 영동세브란스의 경우 최근 들어 최고령환자(84세)에서도 성공적으로 시술하였으며, 대장암의 간전이환자에서 원발 병소와 간절제술을 동시에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술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였다.
·수술 로봇 도입의 의미
첫째, 2년 남짓한 기간에 400회 돌파하였다는 점.
둘째, 한 과가 아니라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외과 등의 여러 과에서 여러 집도의가 수술을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즉, 외과 4명 비뇨기과 3명 흉부외과 1명, 산부인과 2명, 그리고 심장혈관외과 2명 등이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셋째, 수술 중 사고나 수술사망은 한 예도 없었으며 수술합병증도 아주 경미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놀라운 성과는 우리나라에 로봇시스템을 판 미국의 로봇회사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대개 하나 병원에 로봇이 도입이 되면 한 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다른 과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비해 세브란스 병원은 여러 과가 서로 협조하여 로봇을 사용하는 것에 놀란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 수술 받은 기왕력이 있는 비뇨기과 환자 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히 성공한 점도 이슈가 되었다.
이에 미국의 본사에서도 로봇수술 교육기관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세브란스 병원도 이에 대비하여, 로봇 수술연수센터, 복강경 수술 연수센터, 의·치·간 학생 실습센터 및 동물실험/실습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종합 연수 센터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로봇 수술의 대기 환자수가 많아져 새로운 기종의 로봇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수술 로봇의 역사
·1992년 RoboDoc
로봇이 외과적 기계로서 임상적으로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1992년 인공고관절 수술(Artificial Hip Replacement)에서의 이용이었다.
미국에서 개발한 ‘로보닥(Robo-Doc System)’이라는 기구로, 컴퓨터에 입력된 환자의 뼈와 인공관절의 해부학적 상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인공관절이 삽입할 부위를 로봇으로 가공함으로써 수작업에 비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다.
<그림 2>의 RoboDoc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Bargar가 IBM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과 팀을 이루어 고관절 전치환 수술용 로봇으로 개발되었으며, 5자유도의 로봇 팔을 갖는 일종의 CAD/CAM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10,000회 이상의 수술이 이 RoboDoc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보조물과 뼈 사이의 접촉률이 수작업일 때의 20%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평균 97%의 접촉률을 갖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RoboDoc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경기도 수원의 이춘택 병원에 국내 최초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기기인 미국의 RoboDoc을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1천회 이상의 시술을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 윤 용산 교수팀과 충북의대 원 중희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ArthRobot’이 있으며 이는 4자유도의 뼈와 뼈에 어드미턴스(Admittance) 모델을 둠으로써 정확한 경계면을 깎으면서도 작업 시 힘이 적게 들게 하였다. ArthRobot은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임상실험 단계에 있다.
이러한 기구는 수술의 과정 중 일부를 자동화 한 것이지, 실제로 수술 전 과정을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진정한 로봇 수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수술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로봇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강경 수술에서의 응용이라고 생각된다.
·1994년 AESOP
1990년대 들어서 커다란 발전을 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에 있어 로봇에 가까운 기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컴퓨터모션회사(Compu-ter Motion, Inc., Santa Barbara, CA, U.S.A.)에서 개발한 이솝(AESOP), 제우스(ZEUS), 헤르메스(HERMES) 등이 있다. 1994년에 개발된 <그림 3>의 이솝(AESOP)은 복강경 수술에 있어 복강경 카메라를 고정해주고 상하좌우 및 원근을 자유롭게 발판이나 손잡이를 눌러 조절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자의 목소리를 인식하여 동작이 되는 장치로까지 개발되었다.
의료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큰 구미에서는 의료비의 절감과 내구성 및 안정성이 좋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10만회 이상의 수술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후에 개발된 ZEUS 로봇 수술시스템의 기초가 된다.
국내에서도 1996년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복강경적 담낭절제술 및 충수돌기절제술을 보조수술자 없이 이솝(AESOP)의 도움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에 약 7대 정도가 이 장비가 도입이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연세의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2대, 영동세브란스병원에 1대가 있어 총 3대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기대보다는 많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인건비가 비싼 외국에는 많이 사용할수록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구태여 비싼 의료기구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자기가 알아서 수술을 해주는 그런 로봇 수술은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봇 수술이라는 용어보다는 수술 로봇(Surgical Robot)이란 용어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수술 로봇이란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로봇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불가능하던 수술을 가능하게 하거나 시술의 정확성과 성공률을 높이거나 시술 시간 및 비용 단축, 혹은 원격수술 등을 목적하는 로봇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수술 로봇은 미세 수술용 원격수술 로봇시스템, 최소침습수술 로봇시스템, 개복 수술 로봇 등이 연구, 개발, 사용되고 있다.
·1998년 Zeus
그 동안 여러 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현재 로봇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몇 가지 있으며, 그 중 최근에 실제로 상용화 되어 판매되고 있는 시스템(Commercially Available Telerobotic Surgical System)은 <그림 4>의 제우스 시스템(Zeus)과 다빈치(da Vinci System)의 두 가지가 있다.
Yunlun Wang 박사가 컴퓨터 모션사를 만들고 이솝(AESOP)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동안, Frederic Moll 의사가 인투이티브 회사(Intuitive Surgical, Inc.)를 시작하면서 다빈치(da Vinci)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이 기계를 이용하여 1997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환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 1년 후 컴퓨터 모션사가 제우스(Zeus)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두 시스템은 비슷한 기구이지만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첫째 제우스는 복강경 수술과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데 비해 다빈치는 입체영상(Stereoscopic Image)하에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제우스는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수술하는(5 자유도 구현)데 비해 다빈치는 기구가 손목처럼(Endowrist System) 마음대로 구부러지는 동작을 구현함(7 자유도 구현)으로써 마치 환자의 바로 앞에서 바로 보면서 자유로운 동작을 구현하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구가 발전하여 현재의 da Vinci System은 4개의 로봇 팔을 가진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미국 FDA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한동안 로봇 수술은 ‘제우스’와 ‘다빈치’의 두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었으나, 최근 ‘제우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다빈치’의 회사에게 합병을 당하여 이제는 ‘다빈치’의 독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빈치 수술 로봇 시스템 
<그림 5, 6>의 다빈치 시스템은 다음의 세 개의 부분, 즉 로봇 카트(the Robotic Cart), 수술 콘솔(the Operating Console), 그리고 복강경 부분(Endoscopic Stack)으로 나누어진다.
로봇 카트는 약 2m의 높이에 544kg의 무게를 가진 실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로봇 팔 부분으로 환자의 위나 옆에 위치하게 된다. 복강경 카메라를 고정 및 조정하는 팔이 가운데 있으며, 수술용 기구가 작동되는 팔이 3개가 더 있다. 이 기구가 수술 콘솔에서 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동작이 전달되어 작동되는 것이다.
수술용 기구가 작동되는 팔은 7자유도를 구현함으로 수술자의 손동작을 거의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수술 콘솔은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양안 화면이 있으며, 기구를 작동하는 컴퓨터장치가 있다. 수술용 기구를 조정하는 매스터 제어기 (Master Instrument Controllers)가 있으며, 의사는 조정장치 앞에 앉아서 편안히 손을 얹어 놓고 기구를 작동하면, 그 동작이 콘솔에서 로봇 카트로 전달되어 수술용 기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수술 콘솔에는 몇 개의 발판이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전기 소작을 하거나 또는 기구조정장치나 복강경카메라 등의 움직임을 교대하는 각각의 발판으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다빈치의 장점 중의 하나는 복강경 수술뿐 아니라 일반 수술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다빈치의 이용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진가는 복강경수술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입체시야 하에서 마치 자기의 손목동작과 같이 구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서는 할 수 없었던 기존의 복강경 수술보다 월등한 면이 있어 최근에 미국의 경우 폭발적인 증가가 있으며, 최근 미국의 경우 다빈치 중 반 이상이 비뇨기과수술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수술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술로봇의 전망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복강경 수술은 수술의 정보세대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과도기적 기술이고 로봇의학, 원격수술, 가상현실 등이 다음 혁명단계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어디서나 원격교육(Tele Education)이나 모의수술연습(Surgical Simulation)같은 새로운 교육적인 기회에 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교육적인 과정의 보다 많은 확장을 직접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술 로봇들은 아직은 로봇 혁명의 시작일 뿐이다.
현재의 로봇 수술은 수술콘솔 또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수술 전 검사의 영상이 워크스테이션에 같이 보이거나 중첩되게 보이게 하여 수술 전이나 또는 수술 중이라도 영상을 보면서 수술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기계는 촉감을 느끼는 데 아주 부족한 시스템인데 비해 이러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동작도 훨씬 자유로운 시스템이 개발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시스템이 크고 무거운데 점차 작고 가벼운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이며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발전을 거듭하면, 결국 시스템이 점점 지능적이 되어 수술을 스스로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의사가 미리 계획 세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 발전하면 스스로 치료를 하는 시스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격수술의 경우 아직은 수술자와 로봇 팔 간의 시간차가 있어서 동작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점차 개발이 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예를 들면 전쟁터의 환자나 우주에 있는 환자 등)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나노기술(Nanotechnology & Microelectornechanical Systems)의 발전으로 기구나 로봇이 점차 작아져서 작은 로봇을 혈관 내로 주입하여 항로를 결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단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결론
국내의 의료 로봇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실정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의 효용성이 이미 증명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점차 확대되어 가라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료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면서 의료 로봇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 로봇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와 로봇관련 전문가가 적극적이고 규모 있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