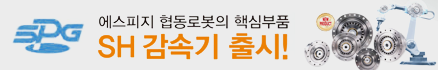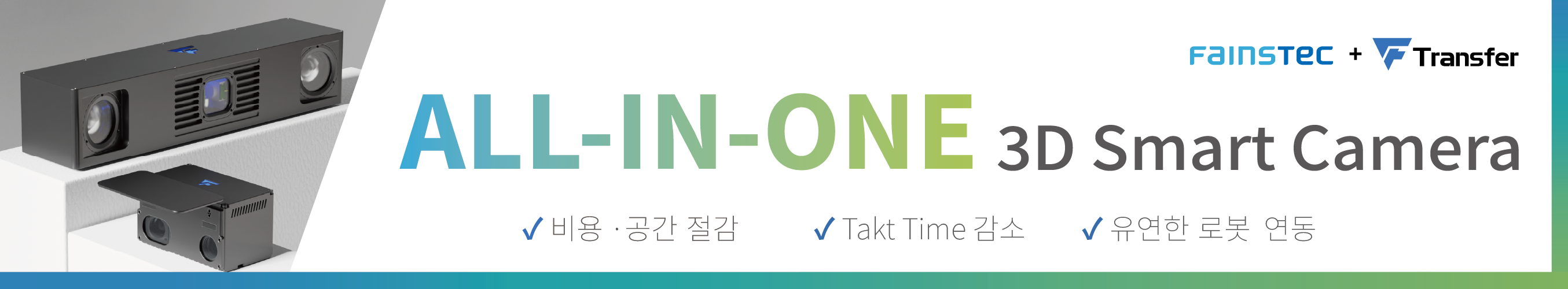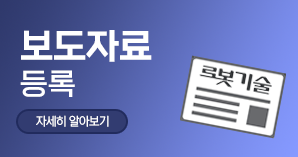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2014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업계가 주목하다
<편집자 주>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있어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9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2014는 올해 처음으로 조직된 웨어러블 로봇 전문 심포지엄으로, 관련 분야의 여러 석학들의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 역시 관심이 높다. 이에 본지에서는 직접 현장을 찾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승남 연구원의 참관기를 소개한다.

H2 외골격 시스템의 시연장면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스페인 바이오나의 Parador de Baiona에서 착용형 로봇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2014, WeRob 2014)이 개최됐다. WeRob 2014는 올해 처음으로 조직 및 개최된 착용형 로봇 전문 학회로서, Neural Rehabilitation Group, Cajal Institute at the Spanish National Resarch Council(CSIC), the Cullen College of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Houston, the Tecnologico de Monterrey(ITESM) 및 University of Twente 등의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이들 모두 착용형 로봇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들이며, 이번 심포지엄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착용형 로봇 제작업체들도 대거 시연에 참가해 착용형 로봇과 관련한 세계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WeRob 2014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착용형 로봇분야의 권위자들을 다수 섭외해 Plenary Talk를 풍부하게 구성함과 동시에, 다수의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필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착용형 로봇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각 세션의 발표가 끝날 때 마다 모든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다 같이 모여 해당 세션의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도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각 발표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주제 뿐만 아니라, 착용형 로봇 시스템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철학과 비전들도 제시했는데, 참신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심포지엄 주요 발표논문 발췌 및 요약(논문주제, 저자, 소속기관)
SSVEP based Exoskeleton System
- Seong-whan Lee(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고려대 이성환 교수의 초청강연에서는 SSVEP(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개념이 결합된 하지 외골격로봇에 대한 BMI(Brain-machine Interface) 기반의 제어기법이 소개됐다. 이 강연은 EEG(Ectroencephalography)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착용자는 전진, 좌우 방향전환, 앉기 및 서기와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SSVEP에 대한 주파수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CCA(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기법을 활용했는데,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에는 11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PC는 EEG 데이터를 무선 EEG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하고 주파수 정보를 분석한 다음, 제어 신호 명령을 로봇 외골격에 전송하는 원리이다(본 실험에서는 REX Bionics社의 REX 시스템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LED를 사용한 시각적 자극 기법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유닛이 소개되었는데, 정보에 따라 자극 주파수를 추출하기 위해 CCA를 이용하여 EEG 신호를 분해하는 기법이 동원됐다. CCA는 두 개의 정규 변수 X, Y 사이의 상관관계가 최대가 되는 선형조합을 찾을 수 있는 다변량통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데이터 세트인 X(t)에서는 EEG의 2초 구간의 윈도우를 선정해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이렇게 추출된 다섯 개의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 다섯 개의 기준 주파수 세트 Yi(t)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CCA를 활용해 정규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최대화하는 가중치 벡터를 논문에서 제시한 공식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피험자는 외골격에 장착되어 있는 LED에서 발생하는 점멸 주파수별 동작 패턴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의 신호를 BMI 기반의 SSVEP를 통해 측정함과 동시에, 시각적 반응과 관련된 EEG 데이터는 CCA를 통해 추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외골격의 동작 패턴별로 대응되어 있는 LED의 주파수별 시각 자극을 각각의 EEG 데이터로 추출하여 외골격 구동을 위한 동작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뇌의 신호를 로봇 구동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험자들은 짧은 오프라인 실험 직후에 외골격 제어를 위한 직관적인 온라인 BMI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발표에서 제시한 실험결과는 비교적 간단한 5개 계층의 CCA 기반 SSVEP 분류기를 사용해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더욱 복잡한 분류법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각적 시뮬레이션 유닛을 이용한 접근은 인간-기계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착용자로 하여금 제어방식을 직관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발표자는 시스템의 분류성능을 높이기 위해 CCA는 사전에 오프라인 실험에서 교정되었으며, 온라인 실험에서 91.3%의 정확도와 3.281.82s의 응답시간을 보였다고 밝혔다.
Wearable Exoskeletons : Limitations and Challenges
- Amit Goffer(ReWalk Robotics Ltd., Yokneam, Israel)
마비환자들은 동작의 제약성으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제약과 위축, 건강 저해,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근력지원용 외골격은 직립보행과 같은 이동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도구이다. 발표자의 분석에 따르면, 직립보행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1)군사, 스포츠, 물리적 작업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근력증강형 외골격 시스템(ex. HULC, HAL)
2) 물리적 재활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외골격 시스템(ex. RGO, LOCOMAT)
3) 일상보행지원 시스템(ex. Rewalk, Ekso, Indego)
여기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반인, 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카테고리는 처음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잘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유사하게 사용하지만, 이로 인해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직면하는 제약사항도 물론 존재한다는 점을 발표자는 강조했다.
본 논문에서, 현재 외골격 시스템들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주로 다룬 사항은 보행기능 구현과 관련된 것이다. 발표자는 현재 외골격시스템의 단점이라 규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안정성(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미적, 산업적 디자인과 제품의 사이즈 ▲하중 ▲보행속도 ▲소음 등이 그것이다. 사용자들(특히 마비환자들)의 경우, 외골격 시스템 없이는 자신들 스스로 자세를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전히 사용자들을 넘어지는 것에 대해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 및 사이즈, 하중, 보행 속도, 소음 등 단점들 역시 잠재적으로 무릎과 고관절에 DC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이는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덩치가 크고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시스템의 사이즈 증가를 초래함과 동시에 착용상의 불편함을 야기하며, 이는 제품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착용형 에어백을 적용해 착용자가 넘어지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부풀어 올라 착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면 반력 센서를 적용함으로서 착용자가 넘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보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발의 지면반력 센서를 통해 측정한 값이 미리 설정한 기준치 이하일 경우, 이를 사용자가 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유연재질의 구동기를 적용하는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작은 소음, 시스템 경량화, 다리부 외골격의 크기 축소, 사용자의 착용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저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역시 ▲마비환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신체상의 노출부위에 대한 낙상 시 부상우려) ▲유·공압 기반 시스템 자체의 특성이 가지는 한계점 ▲크고 무거운 백팩(Backpack)이 필요하다는 점 ▲상체 외골격의 부피증가를 수반한다는 점 ▲많은 수의 구동기를 적용해야하는 점 ▲유지보수의 한계성 ▲시스템 자체의 유연성 및 업그레이드의 한계성 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Gel 기반 인공근육은 매우 조용하며 유연하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압과 작은 출력 및 동작반경으로 인해 아직 외골격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필자의 견해로도 당분간은 유연 재질 구동기 보다는 전통적인 구동기들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룰 것이라 생각되지만, 꾸준히 이와 같은 유연 재질 구동기 기반 외골격 연구가 유명 연구기관들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년 뒤의 구동기 연구 분야의 판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Rex 외골격 시스템의 시연장면
Comparison of the therapy with the Exoskelettons Rewalk, Ekso and HAL
- Wietse van Dijk, Cor Meijneke and Herman van der Kooij(Center for Spinal Cord Injury and Orthopaedic Surgery, Berufsgenossenschaftliches Klinikum Bergmannstrost, Halle/Saale, Germany)
본 발표는 각종 유명 외골격 시스템을 두루 임상에 사용한 연구기관의 중간 결과 발표 같은 성격을 지닌 터라 시스템 개발자들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 모두의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발표자에 의하면, 의료계에서는 척추질환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목적으로 외골격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외골격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는 2013년 2월부터 Rewalk와 Ekso 시스템을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2014년 4월부터는 Ekso와 HAL을 환자에게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치료를 통한 징후변화, 재활치료동안의 문제점, 환자에 대한 정신적 효과 등이 평가되었으며, 환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Rewalk와 HAL을 통한 재활치료는 서로 다른 체구의 환자들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구적 보정, 특히 HAL은 전극부착 등의 과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또한 과체중을 가지는 환자들에 대한 Rewalk의 적용은 해당 장비의 고정부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특히 Rewalk는 자신의 몸통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환자(Paraplegia sub Th8)들에게 사용해야만 했다고 한다. Ekso의 경우에는 완전한 Paraplegia sub Th3를 가지는 환자들에 유용했으며, 다양한 지원기능을 활용해 불완전한 Paraplegia 및 Tetraplegia를 가지는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유용했다고 한다. 끝으로 HAL의 경우에는 특별히 불완전한 Paraplegia 및 Tetraplegia 환자와, 얀다(Janda)식 치료법을 통해 정상 수준의 2~3/5의 다리운동 기능을 가지는 환자들에게 사용했을 경우 특히 적합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양한 외골격 장치를 활용하면서 발표자는 보행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경직, 신경병리학적 통증, 변비 등의 증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최근에는 보행의 정신적인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환자들이 체중이 줄거나 재활치료시의 근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으며, 이를 근거로 외골격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척추손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Developing Exoskeletons to Enhance Running Speed
- Thomas G. Sugar, and Jason Kerestes(Engineering Department at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Sugar 교수는 이번 학회 발표에서 일반인들의 주행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외골격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발표장에서 전문 육상선수와 착용형 외골격 시스템을 착용한 일반인들과의 달리기 시합 동영상을 소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저자는 착용자의 주행속도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외골격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발목관절의 Plantarflexion 뿐만 아니라, 고관절의 굴전과 신전 근력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압식 구동기를 통해 허벅지의 밀고 당김, 양방향 구동식 스프링을 통해 발목 관절의 당김 동작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주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발목의 Push-off 힘이 커져야 하며, 이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면반발력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개발됐다. 발표자가 수행한 기존 연구에서는 스프링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를 재빨리 방출하는 방식의 Robotic Tendon System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발표자는 기존 연구에 무릎과 발목을 연결하는 양방향 스프링 시스템을 추가했는데, 지지구간 중에 스프링은 다리 상부 및 공압 실린더에 의해 인장되며, 축적된 스프링 에너지는 착용자의 Push-off 구간동안에 방출되는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 사용된 공압 실린더는 작은 연필크기에 불과하다.
또한 보행시의 지지구간은 전체 보행 사이클의 약 0~40%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발목 관절은 80㎏의 체중을 가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약 1000W의 최대 Push-off 힘을 발휘하고, 고관절은 신체가 직립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비율의 저항력을 생성한다. 스윙 구간에서는 고관절 및 무릎관절의 힘이 서로에 대해 반대방향으로 주기운동을 한다. 발목에서는 모터의 최대 Power를 경감해주는 목적으로 Translating Spring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한다. 즉, 발의 Dorsiflexion을 통해 에너지가 저장되며, 이는 착용자를 앞으로 전진 하도록 하는 추진력으로 사용된다.
발목과 무릎관절을 연결하는 스프링은 이러한 Dorsiflexion동안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다리 상부에 의해 신장된다. 그 다음 동일한 스프링이 발목을 Plantarflexion 시키기 위해 위의 방향으로 끌어올리는데, 발목의 Plantarflexion로 저장된 에너지는 착용자의 전진 시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다.
실험을 위해 완전히 외부 연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휴대용 시스템이 고안되었으며, 고압력의 에어탱크가 사용됐다. 66㎏의 피험자가 투입되었으며, 대략 94N이 허벅지 부분의 외골격 플레이트에 1.8m/s의 속도로 가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각각의 다리에 170W의 힘이 전달된 것에 해당한다. 발목에는 대략 123N의 힘이 Bungee Cord(신축성 있는 고무끈)에 의해 1.6m/s의 속도로 전달되었는데, 이는 각 다리별로 200W의 힘이 전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2.7m/s의 주행에서 약 8% 에너지 감축효과를 보였으며, 3.6m/s의 주행에서는 약 10.2% 에너지 감축효과를 보였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린더의 구동을 활성화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해당 시스템은 위상 발진기(Phase Oscillator)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각각의 힘은 사인 위상각을 기반으로 전달되고, Limit-cycle이 유지되도록 동작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다리 상부에 대해서 허벅지의 관성은 I, Damping은 b, 허벅지의 탄성계수는 k로 정의할 수 있는데, θ로 표현되는 허벅지의 회전운동을 측정하는데 자이로 센서를 사용했다.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위의 식에서 만약 c가 양수이면, 시스템은 앞뒤로 진동한다. 에너지는 항상 반동하게 되는데 이는 θ의 1차 미분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 분자가 소거되면서 c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c가 음수이면 에너지는 소멸되며 시스템은 0의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큰 c값을 가질수록 시스템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위상각은 500H㎐에서 계산이 되며, 위의 식에서 보인 비선형 가진 함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가진 함수는 노이즈에 강건하다. 이 함수는 ±c보다 클 수 없으며, 허벅지와 발목의 진동 운동을 지원한다. 아래의 그림은 Treadmill에서 조깅을 통해 추출한 시스템의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착용자의 다리 위상각에 대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시스템의 제어신호가 발생하여 착용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
WeRob 2014는 착용형 외골격 시스템 분야 연구 개발자들과, 이들 시스템을 활용한 일상생활 지원 및 재활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학회이다. 2008년경 스페인의 Jose L. Pons 교수가 착용형 외골격 분야의 기본개념과 연구사례를 묶어 편찬한 ‘Wearable Robots - Biomechatronic Exoskeletons’라는 외서를 처음 접했을 때,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Pons 교수의 시도를 높게 평가했었다. 그런 그가 6년 뒤에 WeRob 2014의 Chair로서 다시 한 번 착용형 로봇 연구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금번 학회 역시 의미 있고 중요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촉매로 각국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WeRob 2015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는 착용형 로봇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내용은 지면상의 이유로 재편집되었습니다.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www.mater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