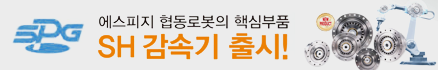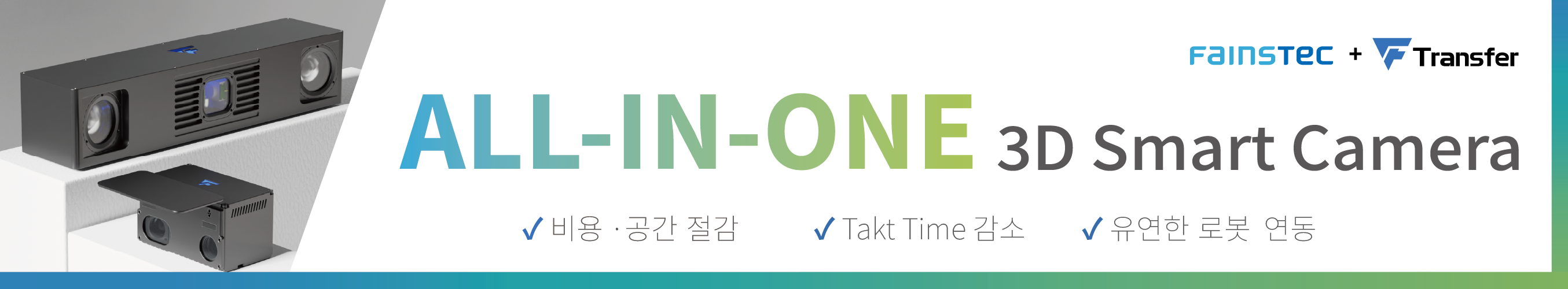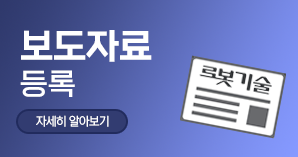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KAIST GCC)가 주관한 ‘제17회 KAIST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서 로봇기술 혁신 포럼이 열렸다. 다임리서치와 한국로봇산업협회(KAR), KAIST 교수진이 참여해 로봇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다양한 산학 협력 과제들도 소개됐다. 현재 KAIST GCC는 한국 로봇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히 미국 보스턴에서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AIST GCCW 2024' 중 'KAIST 산학협력 챌린지 대회' 기념사진 / 사진. 로봇기술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이하 KAIST GCC)가 주관한 ‘제17회 KAIST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퍼런스 및 워크숍(이하 KAIST GCCW 2024)’이 지난 11월 5일(화)부터 6일(수)까지 양일간 카이스트 본원 KI 빌딩에서 진행됐다. 이 중 로봇 분야를 다루는 ‘로봇기술 혁신 포럼 및 KAIST 산학협업 챌린지 대회’는 행사 둘째 날인 11월 6일(수) 오후 시작됐다.
다임리서치, 자동화 미래 패러다임 제시
행사는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현직에서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로봇 산업 일선의 전문가들이 강단에 올라 각자 준비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 자율화·무인화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 다임리서치 장영재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다.

다임리서치 장영재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로봇기술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공장 시스템은 20세기 초 포드 자동차의 도입 이래 지난 100년 동안 제조 자동화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컨베이어 벨트 기반 자동화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예컨대 높은 무인화를 달성한 테슬라(Tesla) 기가 팩토리의 경우 로봇이 차체를 싣고 다니며 필요한 공정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즉, 기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벨트리스 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영재 대표는 “다임리서치를 창업할 당시 제조업 분야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지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스타트업은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포착한 뒤 과감한 투자와 기술을 활용해 큰 변화의 물결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다임리서치의 솔루션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AI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관제 솔루션을 운용하면 전체적인 공정 시간이 20~30% 향상되고, 기존 1,000대 필요하던 로봇을 800대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임리서치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장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의 공장에도 자사 솔루션을 공급 중이다. 장영재 대표는 “최근 증가하는 미국 수요에 힘입어 보스턴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시리즈B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혁신에서 사회 혁신으로
이어 한국로봇산업협회(KAR) 김진오 회장이 ‘성공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로봇산업협회(KAR) 김진오 회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로봇기술
김진오 회장은 한국 로봇 산업에 대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로봇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 역시 중국 로봇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로봇 산업은 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가진 분야”라며,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 공학 역시 다양한 분야와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로봇공학의 열쇠, 기계지능학습
한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종환 교수는 최신의 연구 성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KAIST 김종환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로봇기술
김종환 교수는 기계지능학습에서 인간의 신경망과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로봇의 사회적 지능과 협업 지능을 이야기하며, AI를 활용해 사람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과 허공에서 타이핑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해당 기술들은 서비스,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 산-학 협력 과제 선봬
두 번째 파트로 KAIST 산학협력 챌린지가 이어졌다. 해당 파트에서는 KAIST GCC가 지원하는 ‘글로벌 초격차사업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KAIST 전공생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두고 경진대회가 진행됐다. 참가 기업으로는 자율주행 및 ASR(Autonomous Security Robot) 전문 기업 도구공간, 해양 오염 제거 로봇 기업 쉐코, 건설로봇 기업 고레로보틱스가 참여했다.

심사위원이 KAIST 산학협력 챌린지 대회 참가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로봇기술
도구공간은 AI 기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로봇 관제 소프트웨어 및 다양한 긴급 상황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도구공간은 KAIST 이동규 학생과 협업해 여성 보호용 테스트 로봇 및 관련 기술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표를 진행한 이동규 학생은 “향후 도구공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치안에 필요한 다양한 로봇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쉐코는 해양 기름유출사고에 대응 가능한 아크(Ark)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KAIST 박정우, 이소정 학생과의 협업으로 아크가 수중에서의 작업 시 대형 선박, 전파 등 간섭으로 GPS 신호가 끊기는 현상을 해결했다.

본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한 KAIST 강태민 학생 / 사진. 로봇기술
마지막으로 고레로보틱스는 KAIST 강태민 학생과 협력해 Core XY 메커니즘을 적용한 EV-봇을 개발했다. 해당 로봇은 승강기 버튼 제어에 활용되는 로봇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버튼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추고 있다.
로봇 기업 글로벌화 지원
KAIST GCC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을 통해 국내 로봇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AIST GCC는 최근 미국 로봇 기업 매스로보틱스(Mass Robotics)와 공동으로 보스턴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 투자자 연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KAIST GCC의 문자영 연구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로봇 기업들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전하며, “KAIST GCC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로봇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