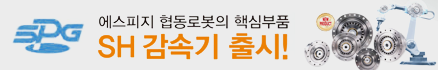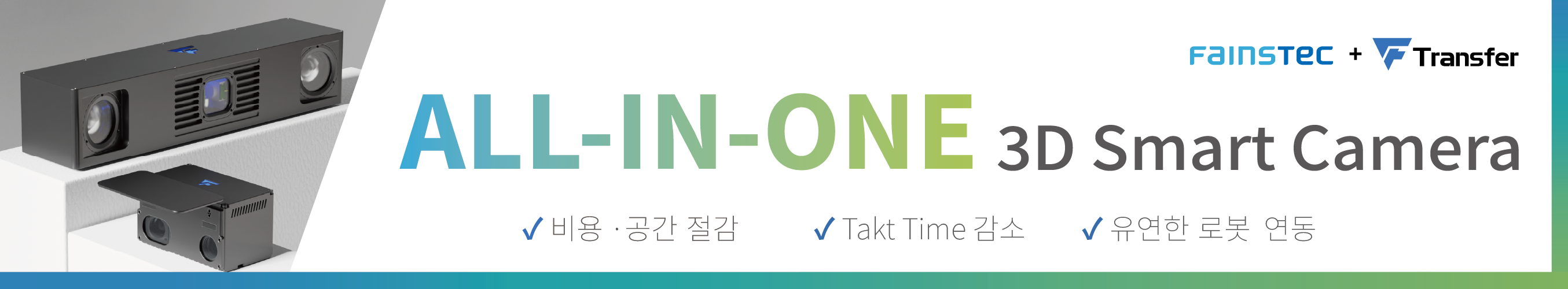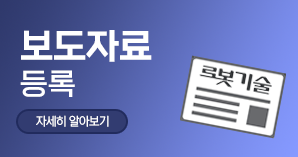이기석 연구자(MIT Brain & Cognitive Sciences Department)
인공지능의 시대를 목도한 지금, 딥러닝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딥러닝을 이용해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젊은 과학자가 있다. MIT Brain & Cognitive Sciences Department 소속의 박사과정 이기석 연구자는 뇌과학과 공학을 함께 연구하며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기계·건설 공학연구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기석 연구자와 그의 연구를 소개한다.
이기석 연구자가 참여한 논문의 서지 정보 ? Kisuk Lee, Aleksandar Zlateski, Ashwin Vishwanathan and H. Sebastian Seung, Recursive Training of 2D-3D Convolutional Networks for Neuronal Boundary Prediction, NIPS 2015. ? Aleksandar Zlateski, Kisuk Lee and H. Sebastian Seung. ZNN ? A Fast and Scalable Algorithm for Training 3D Convolutional Networks on Multi-Core and Many-Core Shared Memory Machines. IPDPS 2016. ? Aleksandar Zlateski, Kisuk Lee and H. Sebastian Seung. ZNNi ? Maximizing the Inference Throughput of 3D Convolutional Networks on Multi-Core CPUs and GPUs. SC16. |
Q. 귀하에 대한 소개.
A. 뇌와 컴퓨터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 뇌의 측면에서는 이른바 ‘커넥토믹스(Connectomics)’ 또는 ‘계산신경해부학(Computational Neuroanatomy)’을, 컴퓨터의 측면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연구하고 있다.
Q. 커넥토믹스라는 연구 분야가 생소한데.
A. 커넥토믹스는 뇌 신경망 연결지도, 이른바 ‘커넥톰(Connectome)’을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신경회로의 구성 및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뇌과학 분야이다.
1㎣의 포유류 대뇌피질 조직샘플에는 약 5만 개의 뉴런(신경세포)과 3억 개의 시냅스(뉴런간의 연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커넥토믹스의 당면 목표는, 이 1㎣ 크기의 포유류 대뇌피질 조직샘플 안에 담긴 신경회로를 개별 시냅스 수준에서 3차원적으로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 3차원 전자현미경(High-throughput 3D Electron-microscopy) 기술을 이용해서 뇌조직의 3차원 이미지를 나노미터 해상도로 촬영하고, 3차원 이미지 안의 개별 뉴런을 모두 구획해 신경회로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
하지만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엄청난 이미지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해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커넥토믹스의 성패는 이미지 분석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커넥토믹스는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던 분야이고, 최근 딥러닝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야이다.

커넥토믹스의 이미지 분석 파이프라인(자료. Talmo Pereira, http://talmo.pe/stitch/)

3차원으로 재구성된 소규모 신경회로(자료. Kasthurietal, 2015)
Q. 귀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소개.
A. 커넥토믹스의 핵심인 자동적 이미지 분석에 딥러닝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3차원 컨볼루션 신경망(3D Convolutional Network) 모델을 3차원 전자현미경 이미지에 적용해 뉴런 사이의 경계(Boundary)를 획정하는, 이른바 Neuronal Boundary Detection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외에도 다른 여러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시냅스를 탐지하는 Synapse Detection 문제, 뉴런의 수상돌기(Dendrite) 및 축삭(Axon), 신경교세포(Glia) 등 뇌조직에 존재하는 여러 조직 부류를 탐지하는 Semantic Segmentation 문제, 그리고 앞선 컴퓨터비전 알고리즘들의 실수로 인해 조각난 뉴런들을 다시 한데로 엮어 완성시키는 Supervoxel Agglomeration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모든 커넥토믹스-컴퓨터비전 문제에 딥러닝을 적용시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Q.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어땠나.
A. 현재 몸담고 있는 MIT 뇌인지과학과(Brain and Cognitive Sciences Department, BCS)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뇌과학 및 인지과학 연구소이다. 뇌과학은 나노미터(10-9m)부터 수십 미터(1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다채로운 연구들의 총체이다. 분자 및 세포 수준, 개별 시냅스 및 뉴런 수준, 신경회로 및 거시적 뇌영역 수준, 인지 및 행동 수준, 그리고 각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수학적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연구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를 반영해 MIT 뇌인지과학과에는 네 개의 세부전공(Cognitive, Cellular & Molecular, Systems, and Computation)을 두어서 개별 세부전공의 전문성과 세부전공 간의 융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본인은 그중 Computation Track에 속해있지만 연구실 로테이션과 교과목 수강을 통해서, 또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상시적으로 교류하면서 뇌과학에 대한 융합적 관점을 형성해가고 있다.
한편 MIT 뇌인지학과 건물은 단일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뇌과학 연구소로서(2005년 기준), 맞은편에 위치한 MIT Stata Center와 함께 캠퍼스 안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MIT 전기컴퓨터공학부 건물인 Stata Center에는 인공지능의 산실인 MIT CSAIL(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실)이 위치해 있어 인공지능과 뇌과학 사이의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MIT 뇌인지과학과 건물(左)과 MIT Stata Center(右)(사진. Wikimedia)
Q. 지도교수에 대해서도 소개하자면.
A. 지도교수인 Sebastian Seung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분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2010년 TED 강연, 그리고 커넥토믹스의 비전을 담은 그의 첫 저서 ‘커넥톰, 뇌의 지도(김영사, 2014)’ 등으로 한국에도 알려져 있다. 또한 그가 과거 Bell Lab에서 연구하던 시절, 당시 그의 박사 후 연구원이었던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Daniel D. Lee 교수(펜실베니아대)와 함께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NMF)’이라는 알고리즘을 고안하고 이를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해 뇌과학적 함의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에 호암상 공학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론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이후 이론신경과학(Theoretical Neuroscience)으로 전향했던 그는 이론신경과학자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반납하고 다시 커넥토믹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이기석 연구자의 지도교수인 Sebastian Seung 교수(2010년 TED 강연 中)
Q.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또는 유학 준비생)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싶나.
A. 기초적인 수학적 배경 지식을 탄탄히 다져놓기를 권한다. 수학은 과학의 언어이고, 과학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연구를 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학부 때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고 또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한다.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신경동역학적 계산(Neuro-dynamical Computation)과 마찬가지이고, 인공지능 역시 이러한 계산과정을 수학의 언어로 근사(혹은 재창조)한 것이다. 수학의 언어 없이는 계산을 말할 수 없고, 계산적 토대(Computational Foundation) 없이는 그 어떤 지능(생명체의 그것이건 인공지능이건)도 설명할 수 없다.
Q. 연구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은?
A. 현재는 주로 Feedforward Convolutional Network 모델만을 다루며 Neuronal Boundary Detection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 Feedback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 LSTM(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및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등 보다 폭 넓은 딥러닝 모델들을 연구하고 이를 커넥토믹스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제 커넥톰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병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계산신경해부학(Computational Neuroanatomy) 연구에 집중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제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는 ‘신진연구자인터뷰’ 코너를 통해 로봇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석사 졸업 이상, 40세 미만의 연구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분야의 대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진연구자인터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열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재들이라면 누구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성과를 알릴 수 있다. 신청은 전화 또는 메일(TEL : 051-510-1384, E-mail : ariass@naver.com)로 문의할 수 있다. |
기계·건설 공학연구정보센터 www.mater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