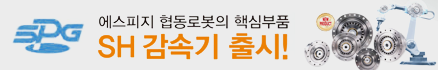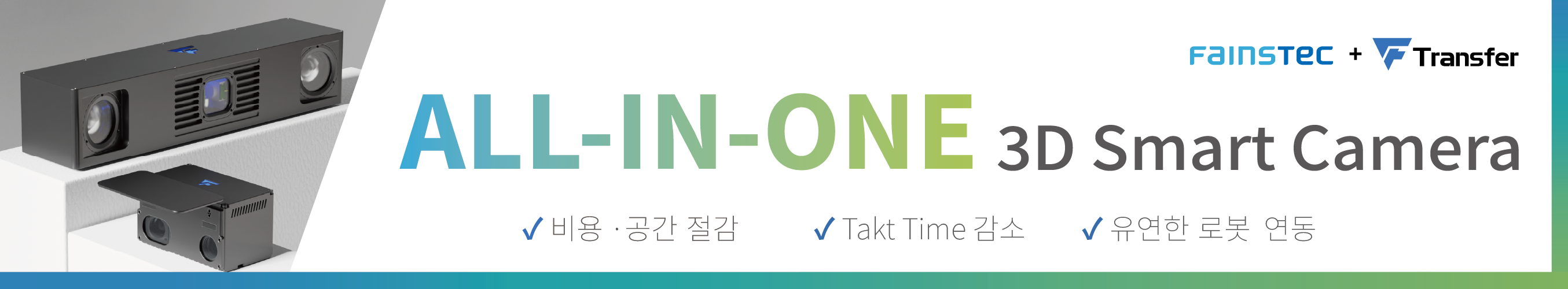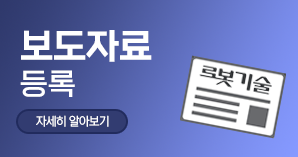“로봇산업에는 디자인중심 문화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 (미술학석사) |
지난해, 로봇관련 특별법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법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서 로봇산업을 꼽는데 이견이 없을 만큼, 이제 로봇산업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국회는 물론 정부기관과 민간사업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성장률은 이제 양적인 면에서 세계 수준에 올랐으며, 정부는 2013년이 되면 국내 로봇총생산을 자동차 산업 규모와 맞먹는 3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민간로봇 사업체는 물론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로봇시장이라는 블루오션에서 아직도 시장성을 확보한 성공적인 제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로봇 강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적인 면에서 로봇은 산업계에 등장한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질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 산적해있다.
‘진보된 기술에 비례해 성공한 시장상품의 결여’는 현재의 로봇 산업분야만이 고민했던 문제는 아니며,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기술 중심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반복되던 고민거리였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의 해결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로봇 산업 중흥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널리 알려진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사례는 현재 우리의 로봇산업에 많은 배울 점을 시사한다. 그의 축음기는 세계 최초였고, 타제품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졌으며 기술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축음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진정한 사용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경쟁사들은 비록 음질이 떨어지더라도 에디슨이 제안한 실린더 형이 아닌 보관이 용이한 디스크 형태의 녹음 매체를 발전시켰으며, 에디슨이 녹음이라는 기능에 가능성을 둔 반면, Victor社와 같은 경쟁사는 녹음된 음악의 재생이라는 것에 축음기의 미래를 두었다. 결국 에디슨의 축음기는 시장에서 사라졌고, 경쟁사는 살아남았다.
여기서 우리는 소비자를 이해한다는 것, 인간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제품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배워야 한다. 최고 기술을 가진 제품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인지과학 분야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상을 수상한 바 있는 Donald A. Norman 박사는 그의 저서, ‘Invisible Computer(1998)’에서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 요소가 기술적 진보 위에서 이를 지배하고 있다’고 직설한다.
초기 기술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Sony社의 Aibo처럼 기술 주도형제품은 소비자의 시선을 끈다. 그러나 기술이 많이 성숙했을 때, 기술 자체는 당연시되고 사용자는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편리함이나 사용자의 경험과 같은 인간 중심적인 기술이다. 기술은 변하기 쉬운 반면, 그 기술이 사용되는 인간환경 즉, 사회적, 조직적, 문화적 측면은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욕구를 가장 쉽게 발견하고 또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느끼도록 만드는 핵심은 바로 문화 콘텐츠 및 디자인 개발에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들의 욕구와 그것의 표출이 응집된 형태로 전래되어온 과정이기 때문이다. 로봇 디자인 연구에 관심을 두며, 필자가 겪어온 몇 가지 성공적인 로봇 디자인개발 사례는 철저히 사람들 즉 사용자를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용자의 일상적인 문화에서부터 로봇개발 콘셉트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 개발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로봇으로 발전하게 한다.
로봇은 지금까지 제안된 바 없는 새로운 기능과 형태의 제품이다.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며 인간과 흡사한 형태를 띠기도 하고 이 때문에 감성적 인터랙션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효과적인 행위 유발을 통해 로봇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휴대폰, 컴퓨터, 메신저가 그러했듯이 사용자들에게 있어 로봇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궁무진하며, 새롭게 제안될 문화 형태 또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2007년 제 1회 ‘로봇과 문화 포럼’을 주도한 이래, 올해로 8회를 맞이하였다. 이 포럼은 로봇 연구자는 물론 기업인, 문화 예술인, 학생과 일반인이 참석하여 미래 생활 속에서의 로봇의 역할과 생활 문화 간의 관계해석 등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가 활발히 교류되고 있다.
로봇의 질적 발전에 대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표적인 로봇연구 관련 학술대회인 IEEE ‘Ro-Man’에서는 몇 해 전부터 ‘로봇 디자인 컴피티션’ 등을 통해 디자이너가 상상하는 로봇을 구상하게 하였고, 2007년과 2008년 Osaka Design Competition의 주제도 ‘로봇’으로 지정될 만큼 로봇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상상의 무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로봇 개발에 있어 문화적 접근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로봇은 제품으로서의 그 발전 과정을 볼 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로봇의 미래는 아직 정확히 그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성공해온 제품들과 특히 빠르게 변하는 정보 기기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볼 때, 로봇 산업을 주도할 혁신적 아이디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 디자인중심 문화 콘텐츠로부터 출발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