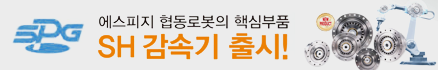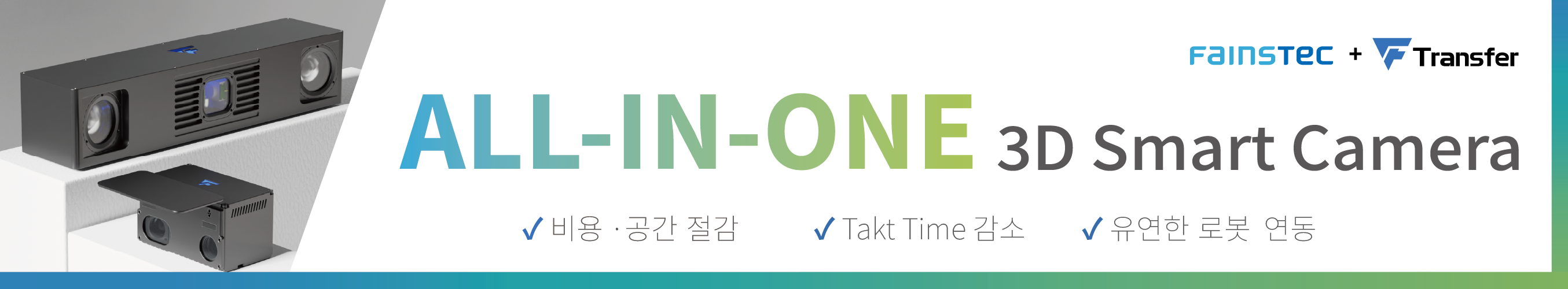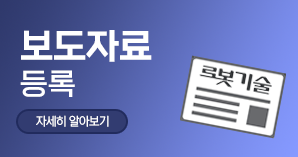레드오션인 제조용 로봇과 시장이 채 열리지 않은 서비스용 로봇 사이에서 전문서비스 로봇의 영역은 로봇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비스 로봇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의료분야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함께 각국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문에서는 수술로봇의 역사와 함께 제조용 로봇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최근 수술로봇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사진. da Vinci 수술 장면>
지난 2009년 수술지원용 로봇시스템인 da Vinci의 임상적용을 승인한 일본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da Vinci를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시스템 수를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세계 2위로 로봇수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는 복부와 흉부외과 분야에서 내시경 수술이 저침습 방식으로 이뤄져왔지만 수술지원용 로봇은 기존의 내시경수술을 훨씬 능가하는 고도의 내시경수술을 가능케 하는 툴로 심장외과와 같은 영역에도 저침습 내시경 수술 시대를 열었다.
일본의 심혈관 외과그룹인 Team Watanabe는 da Vinci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심장외과 영역의 수술에 도전했고, 내시경수술 도입이 지연되었던 갑상선외과에서도 2009년부터 da Vinci 수술이 시작되었다.
da Vinci, 세계 수술로봇 시장을 선도하다
수술지원 로봇개발은 1990년대에 미국의 NASA와 Stanford대학이 국방부의 연구프로그램 추진기구인 DARPA의 예산으로 군사용도의 원격수술용으로 수행한 것이 효시이다. 이후 Intuitive Surgical사가 고도의 내시경수술이 가능한 수술지원용 로봇 da Vinci로 개량하면서 1999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한편 DARPA의 예산지원에 의한 수술용 로봇 Zeus(Computermotion사)는 2001년 뉴욕과 스트라스부르(프랑스) 간의 원격 담낭적출수술에 성공했다(일명 린드버그수술).
2003년 Intuitive Surgical사가 Computermotion사를 합병한 이후 세계 수술지원 로봇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da Vinci는 개량을 거듭하여 제2세대 da Vinci S, 제3세대 da Vinci Si, 최신시스템인 제4세대 da Vinci Xi 수술용 로봇시스템이 발표되었다.
da Vinci는 외과의 콘솔(Surgeon Console), 수술카트(Surgical Cart), 영상카트(Vision Cart) 등 3개 컴포넌트로 구성되는 마스터/슬레이브 수술시스템을 갖는 로봇이다.
콘솔에 위치하는 외과의는 3차원 하이비전 모니터를 보며 핸들을 조작하는 수술카트의 암에 설치된 로봇겸자(Forceps)를 컴퓨터제어에 따라 작동시킨다.
겸자의 끝부분은 내시경수술 겸자(Endorist, Intuitive Surgical사)에 손목의 동작을 가해 7자유도를 가지며 50종류 이상의 형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능은 심부에서의 섬세한 봉합, 매듭을 쉽게 하고 고도의 내시경수술을 가능케 한다.
로봇 종주국 일본, 수술로봇 개발에 박차
산업용 로봇기술에서 세계 정상수준인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일본형 수술지원 로봇시스템개발에 꾸준히 도전해왔다. 게이오대학, 나고야대학, 동경대학 등 수개 대학이 독자적인 로봇시스템 개발에 도전하고, 정부는 NEDO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지원해왔으나 임상 적용에는 실패했다.
수술지원용 로봇시스템에 대한 임상승인을 계속 지연시키던 가운데 일본에서 미국의 Jihnson&Johnson사가 최초로 2009년 11월 da Vinci 시스템의 임상 승인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daVinci 로봇시스템에 의한 수술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2014년 9월 말 18,000건을 돌파했고, 동시에 수술지원용 로봇시스템개발 붐이 조성됐다.
그중에서도 동경대학 및 동경공업대학 연구진의 수술지원용 로봇시스템 개발사례는 실용화 또는 상용화에 접근하고 있다.

동경대학 연구진의 초미세수술용 로봇시스템
동경대 로봇연구그룹은 초미세수술(Super Micro Surgery)에 초점을 둔 수술용 로봇의 범용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계획을 제안했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초미세수술을 위한 범용 플랫폼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초정밀기술의 추구’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조작성능 향상과 함께 고도의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초미세수술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수술용 로봇은 조작특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 이를 통해 수술시간 단축, 출혈량 감소, 종양주변 정상조직의 보존, 합병증 리스크 감소 등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로봇수술은 많은 경우 의사의 손기술로도 실현할 수 있는 수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 로봇그룹은 조작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기술로는 수술이 매우 어려운 초미세 수술의 실현을 제안했다. 특히 뇌신경외과, 안과, 소아외과, 정형외과의 경우는 수술 후의 기능회복과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학적 지원이 요구된다.
초미세수술의 실현을 위해서는 초정밀부품 가공 기술과 초정밀부품을 이용한 로봇기구, 고도의 화상처리와 제어 등의 로봇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장점인 초정밀가공기술과 로봇기술을 최대한 살려 장래 아시아 신흥국의 수술지원용 로봇수요에 대비하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수술용 로봇연구가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는 코스트상승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부위나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로봇시스템개발이 과제다. 특히 초미세수술과 같이 공학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수술건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는 시스템에 범용성을 부여하는 것이 실용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초미세수술을 대상으로 연조직 대응 수술용 로봇, 경조직 대응 수술용 로봇, 혈관내부 치료용 마이크로로봇 등 3개의 플랫폼을 제안했다.
*연조직 대응 수술용 로봇
뇌신경외과, 안과, 소아외과를 주요대상으로 한 연조직 대응 미세수술용 로봇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손동작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마스터-슬레이브 타입의 로봇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마스터-슬레이브의 동작배율과 조작성의 관계에 착안해 실제 미세수술에서 수술용구를 가진 자와 수술동작을 하는 자를 참고로 마스터 매니퓰레이터를 새로 설계하고 조작성과 조작시간을 최적화하는 동작배율을 결정했다. 이 결과 뇌신경외과에서는 동작배율이 1/2~1/3배가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시야 밖에서의 수술도구 이동이나 폐색에 대응한 화상처리기술, 로봇수술의 효율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작업의 자동화, 사전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회피 방법 등도 연구 중이다.
*경조직 대응 수술용 로봇 플랫폼
정형외과 영역인 골절을 주요 대상으로 수술용 로봇 플랫폼을 제안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대체차이나 대상변형이 작기 때문에 마스터-슬레이브형 로봇이 아니라 시스템 측이 최적의 수술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수술의가 받아들여 시스템이 자동 실행하는 반자동 로봇타입이다.
뼈 절제 로봇은 무릎의 인공 치환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고관절, 어깨관절, 손가락관절 수술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로봇은 7개축(병진 3축, 회전 2축, 승강 2축)으로 구성된다.
연구그룹은 로봇 플랫폼 개발과 함께 뼈의 가공과 인공관절, 의치 등에 사용되는 생체재료 가공 연구에 적극적이다. 취성 및 섬유성 재료인 뼈의 가공을 위해 뼈 가공 드릴설계연구 등 공구 및 디바이스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생체재료가공은 질코니아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 탄소를 첨가한 티타늄합금의 층 선택적 자기연마, 적층조형 티타늄합금의 표면개질, 인공관절에 대한 초정밀가공방법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혈관 내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플랫폼
연구개발은 저침습·세부·심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 궁극적 목표는 혈관내부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 개발이다.
외부자기장을 이용해 체내를 이동하는 로봇시스템으로서 혈관 내부 치료를 대상으로 미세혈관을 영동하는 마이크로 로봇의 설계제작기술과 유체 내에서의 위치·자세제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구자석을 이용해 체외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여러 유체역학적 변수들을 고려해 유체 내에서의 마이크로 로봇 이동을 모의한 실험시스템을 설계했다. 실험에서 혈류와 같은 유체흐름의 역방향으로 로봇을 이동시키는데 성공했다.
동경공업대 연구진의 공기압 구동형 로봇시스템
일본정부(문부과학성)는 최근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와 연결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START 프로젝트(Project for Creating STart-ups from Advanced Research and Technology, 대학발 신산업 창출거점 프로젝트)의 주요사례로서 동경공업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수술지원용 로봇시스템의 국산화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START 프로젝트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리스크가 큰 종자기술의 사업화 전략으로서, 벤처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정부자금과 민간의 사업화 노하우를 결합시켜 사업화를 유도하는 정부지원 프로젝트다.
근래 외과수술에서는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개복하지 않는 저침습 수술방식인 내시경 외과수술이 일반화되어 왔다. 일본은 내시경수술을 로봇 수술로 대체하기 위한 수술용 로봇시스템 개발 경쟁에서 미국에 완패한 이후 내시경수술방식보다 훨씬 진화된 일본형 수술지원용 로봇시스템의 상품화에 도전 중이다.
내시경수술방식은 카메라 조수가 내시경 조작이 필요하고, 수술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손떨림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로봇으로 해결하려는 수술 지원용 로봇개발을 꾸준히 진행시켜왔다.
현재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의 da Vinci 로봇시스템은 수술의사의 손동작을 정확히 재현하면서 정확하고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수술지원 로봇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수술지원 로봇시스템들은 고가이며(1시스템 당 약 20~30억 원), 장기와 접촉하는 감촉, 수술용 실의 인장감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사의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동경공대 로봇연구진은 약 10년 전부터 공기에 의한 계측제어기술을 이용한 수술지원용 로봇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연구개발 결과 힘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겸자 끝 부분의 접촉력을 겸자 근원부의 공기압 액추에이터 차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주요 개발 포인트는 ▲겸자 앞부분의 접촉력을 겸자에 달린 공기압 액추에이터의 차압으로 추정하는 방법 확립 ▲한정된 수술실 크기를 고려해 전기구동이 아닌 공기압 구동방식으로 겸자와 내시경을 조작하는 로봇 암 개발 ▲기존 제품보다 가볍고, 콤팩트하며, 저가격화가 가능한 특징을 갖는 수술지원용 개발 등이 있다.
이 로봇시스템은 수술지원 로봇의 내시경을 파지하는 로봇암을 이용해 수술의사의 머리에 장착한 자이로센서가 전후-상하-좌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머리의 움직임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조작하는 내시경 조작시스템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수술의사는 두 손이 막힌 상태에서도 내시경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있으며 카메라 조수가 필요 없이 혼자서 수술할 수 있다. 2012년 11월 약사승인 받은 이 내시경 조작시스템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동경공업대학은 이 로봇시스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2014년 5월 벤처기업 Riverfield사를 설립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시경 조작시스템의 국내외 판매에 착수하고, 이후 수술지원 로봇을 제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 회사는 공기압에 의한 초정밀제어기술과 동경공업대학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여러 의료기기개발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 본 내용은 정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ReSEA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필자. 박장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