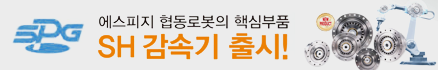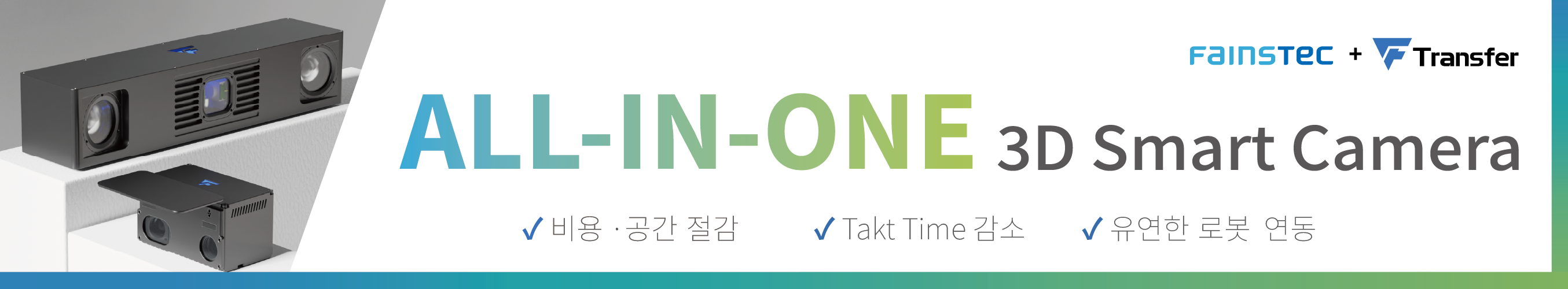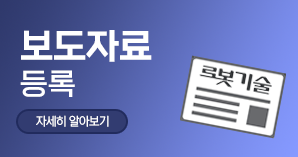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3년 올해의 단어 중 하나로 선정된 드론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템이 됐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2014년 12월 드론을 위한 공항을 따로 구축하기로 했고, 3300만 달러(약 366억 원)를 투자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드론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했다. 전투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이제 택배, 물류, 보안, 감시 등 여러 분야의 공중전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드론(Drone)이란 인간이 직접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등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 및 헬리콥터 형태의 비행체를 일컫는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해 그 활용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처음 군사용으로 개발된 이 드론은 몇 해 전부터 그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민간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기동성에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한 탁월한 감지 능력은 운송, 보안, 감시, 관측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될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공 촬영, 배달, 농약 살포, 공기질 측정 등의 작업을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저가형 키덜트 제품들까지 등장함으로써 개인이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가 됐다.
살상용 무기 드론, 이제는 인류에 유익한 로봇으로!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드론은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처음 개발됐다. 공군의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활용된 드론은 점차 그 영역을 넓혀 정찰기, 공격기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드론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0년대로, 방산전문가 Steven Zaloga의 주장에 따르면 대공포 사격용 연습물체로 개발된 DH 82B Queen Bee에서 비슷한 단어인 드론이란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시절까지만 해도 드론은 원격 조종의 한계로 실 전장 참여보다 교육 및 훈련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드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전인 1916년, 이미 군인 출신 과학자 Archibald Low의 ‘Aerial Target’ 프로젝트에서 최초의 UAV(UAV, UnmannedAerial Vehicle) 개발이 진행됐다. 무기를 탑재한 무인비행체가 원격으로 조작되어 적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

이후 드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군사 강국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드론을 공격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122번 이상 파키스탄과 예멘 등에 드론 폭격을 감행했다. 당시 수많은 민간인 피해에 대해 언론과 여론은 드론 공격에 대해 비난했고, 이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론으로 무차별한 폭격을 가하는 것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현재는 군수용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드론이 적용되는 분야가 넓다.
항공촬영, 시설물 관리, 해안/환경 감시, 대형건축물 감시, 산불/산림 감시, 야간비행, 터널 및 실내비행, 해상/선박 전용, 지형 및 구조물 촬영, 관광지 및 테마촬영, 해상/선박 촬영, 범죄 색출/추적/작전 수행, 건설현장/환경 감시, 영화/드라마/방송 촬영, 실시간 정찰 및 재난구조, 익스트림 촬영, 실시간 정찰, 문화재 시설 관리 등 이미 드론이 적용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상당히 폭 넓다.
한편 여전히 드론 시장에 등장한 무인기 가운데 90%는 군사용이라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드론은 군사용을 넘어 기업, 미디어, 개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에 그 의미가 깊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각 국 정부는 물론 기업들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드론 기술력을 높이는데 더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군수에서 민수로, 그리고 개인으로
군수용으로 개발된 드론을 민간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드론 가격의 하향화 때문이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중의 접근이 용이해진 것이다.
3D Robotics의 3DR IRIS 드론 가격은 자동 이착륙, 자동 복귀, 입력된 GPS 좌표로 자동 비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도 약 750달러에 불과하다. 또 헬리캠으로 유명한 DJI의 드론 S1000은 약 4,000달러로 비싼 편이지만 입문용 제품 Phantom은 약 700달러 정도로 가격부담이 적다. 더 나아가 개인 오락, 취미용으로 제작된 Parrot의 AR Drone은 가격이 300달러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성능이나 기능을 조금 낮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보다도 저렴한 범용 드론 제품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드론을 활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도 접근하기가 용이해진다. 최근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멀티콥터는 수직 이착륙과 정지 비행(Hovering)이 가능하면서도 구조가 간단하다. 이 멀티콥터는 각각의 프로펠러 회전수를 이용해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고 메인터넌스도 용이하며, 특히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이 더욱 부각된다.
더불어 자이로센서와 가속도계를 통해 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수평을 스스로 유지하기 때문에 조종도 쉽다.

국내서도 상업용 드론에 대한 관심 고조
지난 3월 전경련회관에서는 드론과 관련해 의미 깊은 세미나가 개최됐다. ‘상업용 드론 개발 기술 및 사업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위험성, 나아가 개발 중인 기술 등에 대해 소개됐다(관련기사 31p). 이날 소개된 기술에는 영상정보와 드론을 이용한 재난관제시스템과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다뤄졌다.
드론, 아직은 산을 넘어야 할 때
과학기술의 발달 앞에서 인류는 항상 ‘이 기술이 과연 인류에 유익한 것인가’를 고민한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바꿔 말하자면 비윤리적이거나 위법적인 상황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부분이기에 최근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드론을 이용한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과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마약 운반 등 범죄에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드론의 활용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더불어 드론이 지니는 기구적 문제 해결 역시 풀어야 될 과제이다.
가령 드론에 적용된 배터리가 폭발한다면, 비행 중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람이 프로펠러에 베인다면 등 개발자들이 고민하고 넘어야 될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맨하튼에서는 드론이 고층 건물에 부딪혀 보행자들 가운데로 추락한 사례가 있다. 공중 충돌감지 및 회피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인용 드론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사고는 더욱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용자의 활용에 따른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드론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의 한 도시는 실제로 드론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드론 사냥 면허도 등장했다.
아울러 해킹에 의한 드론의 납치나 파괴도 충분히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드론 상용화에 앞서 면허, 운용시간 및 지역, 활용 목적, 표준 규격에 관한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용 소형 드론은 공항 인접 지역 이외의 400피트 이내 상공에서 제한된 비행만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 연방항공청은 Civil/Public UAS(Unmanned Air System)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상업화 드론 법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또한 미 연방항공청은 드론 시험비행장 6곳을 선정해 드론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발표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 역시 유콘시스템을 필두로 LIG넥스원, 엑스드론 등 다수의 기업들이 무인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시장성 높은 드론, 우리도 준비한다!
드론의 시장성 및 적용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16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기·산업발전심포지움’을 개최, 연내에 무인기 시범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인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시장 선도형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로 2023년 매출 세계 4위, 기술 세계 3위권 무인기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다. 시장선점, 기술개발, 인프라·인력, 제도 4개 분야에 걸쳐 무인기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시장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수의 조사기관들이 10년 뒤인 2023년에 군사용을 포함한 드론 시장의 규모가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중 상업용은 현재 기준 약 10%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인기기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미국연방항공청이 드론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해제할 경우 2015년까지 미국에서만 820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하루에 2700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시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공표한 이번 무인기 시범특구 지정은 해당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반석이 될 수 있다.